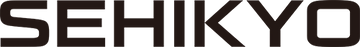Wear Wore Worn, 2021, 서울, 한국
Wear Wore Worn, 2021
2021년 05월 22일 – 06월 06일 더레퍼런스 서울
김서희는 «Wear Wore Worn»에서 ‘입는 행위’의 객체로서 새로운 범주의 ‘옷’을 제안한다. 김서희는 옷이 가진 소비재로서의 의미를 걷어내고 그 지위를 패션 산업에서 잠시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옷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동시에 끊임없는 예술적 실험과 실천을 통해 ‘착용’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동사 ‘입다’의 언어적 활용에서 기인한 전시의 제목 «Wear Wore Worn»은 단어의 형태 그 자체로 옷을 갈아입는 일련의 변태 과정을 연상케 한다. 시간의 흐름, 사회.문화적 배경, 행동 양식, 태도, 취향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변주되는 행위의 문법은 관람자가 각자의 경험과 맞물려 직조된 ‘입다’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상상력을 개입시킬 때 더욱 활성화된다.



Installation view


Engaging or pushing out(T-shirt jacket), 2021
Cotton fabric, wool fabric, cotton thread, shoulder pads, fusing tape
140 x 55 x 120 cm




The right to be a top, 2021
Cotton fabric, coated fabric, padded fabric, cotton thread, zipper


The dressing room, 2021
Cotton fabric, wool fabric, steel, velcro, cotton thread

Storing pieces of stuff in legs, 2021
Used stockings, cotton fabric, coated fabric, cotton thread
87 x 3 x 152 cm


Repair collection: The shaking feet, 2021
Lambs wool yarn, cotton yarn
11 x 2 x 72 cm


Pairing in wearing, 2021
Lambs wool yarn, cotton yarn
50 x 201 cm

Doing a handstand(Skirt hoodie), 2021
Cotton fabric, cotton thread
90 x 120 cm
Wear Wore Worn은 다음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옷’은 일반적으로 ‘입는(wear) 행위’의 객체로 존재하며,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복합적인 배경과 동기를 내포한다. 그러나 행위의 주객을 전도한다면? ‘옷이-사람을-입는다'는 가정이 물리적 관계 안에서 실현될 때 의복의 형태와 착용 개념은 어떻게 달라질까?
김서희는 사회적 관계에 의복 착용이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여, 몸의 모양에서 파생된 옷 조각들을 물리적으로 결합(관계)함으로써 ‘입는 행위’를 탐구한다. 작업은 라틴 속담 ‘Vestis virum facit’ -- 영어로 풀이하면 ‘Clothes makes the man (옷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옷이 날개’라는 말과 상통한다.--과 같이, 옷을 서술어 ‘입다’의 주체로 격상시키는 상상에서 출발하였다.
‘옷’은 착용될 때 언어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두 개념을 획득한다. ‘가리는’ 수단인 동시에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이 두 가지 목적성은 관계 맺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술이 된다. 김서희는 가릴 것과 보여줄 것을 취사선택하는 일, 즉 관습 순응과 개성 표현의 줄다리기 과정만을 본질로 남긴 채 주체와 객체의 교환을 가정한다. 이로부터 사람이 옷을 입는 방식과 옷이 사람을 입는 방식이 실상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프로젝트의 전제로 생각한다. 가령 사람이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재킷을 겹쳐 입은 모습을 상상해보라. 반전된 구도 속에서 주체가 된 옷은 객체로서의 사람을 여럿 수용할 수 있다.
한편, 탈의실은 전적으로 ‘입는 행위’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오직 ‘입기 위해’ 격리된 공간은 그 행위에 신성함을 부여한다.
‘The dressing room’은 탈의실 안에 - 혹은 탈의실로서 - 고정된 옷이 사람을 입는다는 가상의 개념이 시각화된 공간/옷이다. 이때 사람은 공간/옷에 입혀져야만, 공간/옷에 들어갈 수 있다. ‘The dressing room’의 내부에는 ‘입는 행위’에 관한 김서희의 또다른 작업, ‘The skirt’의 일부가 비치되어 있다.
대중은 시장(market)이 원하는 형태의 옷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그 착용 방식을 학습한다. 수요를 담보하고, 생산에 유리하도록 제작된 옷은 착용자에게 수동적인 입기(wear) 행위를 유도하고, 착용자는 이를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인다. 언어 소통에서 발화자 간의 사회적 약속은 늘 개인의 표현보다 우선시되므로, 옷을 통한 비언어적 소통에 있어서도 착용자는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규칙성을 개인의 창조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서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시종 옷이 비언어적 소통의 매개로서 갖는 특성에 주목하며, 소비주의 문화가 주도하는 ‘사회성’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분해함으로써 착용자가 능동적인 창조성을 발현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framework)로서의 옷을 제공한다.
프랙티스에 활용된 ‘몸의 모양에서 파생된 옷 조각’들과 소매, 옷깃, 지퍼, 주머니 등의 요소는 착용자가 학습해온 사회적 입기 행위를 내포하는 동시에,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투영하여 각자의 방식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느슨한 규약이다. 관람자는 낯선 방식으로 배치된 요소들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창조성, 수동성과 능동성, 객체성과 주체성 사이의 갈등을 겪으며 각자의 선택에 따른 행위 문법을 구축하고, 패션 시스템의 대안적 범주를 경험한다. 착용자의 사적 맥락 속에서 활성화되는 행위 문법은 여러 형태의 실루엣으로 기록되는데, 이때 실루엣이 드러내는 ‘입는 대로의 어색함’은 이 일련의 시도가 사회적 합의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방식의 발화 시도임을 방증한다. 입기 행위에 비현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착용자에게 창조적 발화의 도구를 제공하는 작가의 프랙티스는 착용자의 개입을 통해 새로운 문장들 -- 의류의 실루엣 -- 을 만들어내며 그 자체로 패션 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텍스트: 김서희
윤문: 김하은